개봉영화
‘서울의 봄’, 결말 알아도 “분노 끓어”…정우성이 승리하길 바랐다[MD칼럼]
- 0
- 가
- 가

'서울의 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곽명동의 씨네톡]
결말을 알아도 분노가 끓는다. ‘서울의 봄’을 관람한 관객들은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영화라고 입을 모은다. ‘심박수 챌린지’까지 등장했다. 권력욕의 화신 전두광(황정민)과 하나회 일당은 하룻 밤 사이에 폭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1020세대 관객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이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300만을 돌파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김성수 감독은 전두광과 이태신(정우성)의 선악구도로 영화를 만들었다. 전두광이 실제적인 악이라면, 이태신은 판타지적인 선이다.

이태신은 행주대교를 건너 서울로 진입하려는 2공수부대의 탱크들을 맨몸으로 가로 막는다. 소수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반란군 본부로 진격하기도 한다. 이때 카메라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담아낸다. 왜군에 맞선 이순신 장군과 반란군과 대결하는 이태신을 오버랩하는 것이다(이태신이라는 이름은 실존인물 장태완과 이순신 장군을 합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영화에서 이태신은 가공된 인물이다. 관객은 만약 이태신이 이겼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상상하며 영화를 관람한다. 전두광과 싸우는 정우성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이다. 인간은 질줄 알면서도 싸워야할 때가 있으니까.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차가운 겨울밤의 이야기만 전달하지 않는다. 권력을 잡겠다는 사악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반란이 형태만 달라질 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우성 역시 이러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성시경 유튜브에 출연해 "감독님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기 판단,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아했다"면서 "거기에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권력에 미친 자(전두광 이름에서 ‘광’은 미칠 광일 것이다)는 언제든 다시 돌아와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다. 김성수 감독은 "이런 일은 지금도, 늘 벌어진다”고 했다.
‘서울의 봄’이 보내는 섬뜩한 경고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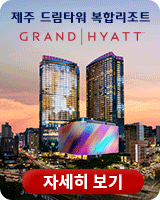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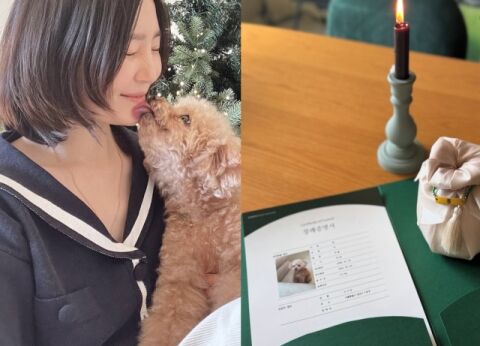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