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남의 풋볼뷰] 스리백은 어떻게 재탄생했나
- 가
- 가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스리백(back three: 3인 수비)은 재탄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지우고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EPL)에서 4골차 대승을 거둔 토트넘 홋스퍼와 에버턴이 모두 스리백을 쓴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리백은 더 이상 옛날 전술이 아니다.
세 명의 수비수를 두는 스리백 전술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원톱 스트라이커를 세운 4-2-3-1 포메이션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쇠퇴했다. 중원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감독들은 포워드를 줄이고 미드필더를 늘렸다. 그 결과 기존 4-4-2 포메이션의 투톱을 상대했던 스리백은 ‘1vs3’의 상황에 놓였고 이는 결국 수적인 ‘과잉’을 초래했다. 실제로 과거 3-5-2 시스템은 4-4-2를 상대로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4-2-3-1(혹은 4-3-3)을 쓰는 팀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이점이 사라졌다.
2007년 브라질 코린치안스를 이끌었던 넬싱요 밥티스타 빗셀고베 감독은 “3-5-2를 쓰는 A팀과 4-3-3의 B팀이 대결할 때 A팀 윙백(wing back)들이 B팀 윙어(winger)를 막는다. 즉, A팀이 B팀 공격수 3명을 막기 위해 5명의 수비를 쓴다는 얘기다. 이때 미드필더에선 3명과 3명이 충돌해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전방에서 2명의 공격수가 4명의 수비수를 상대한다. 이는 풀백(full back)이 자유로운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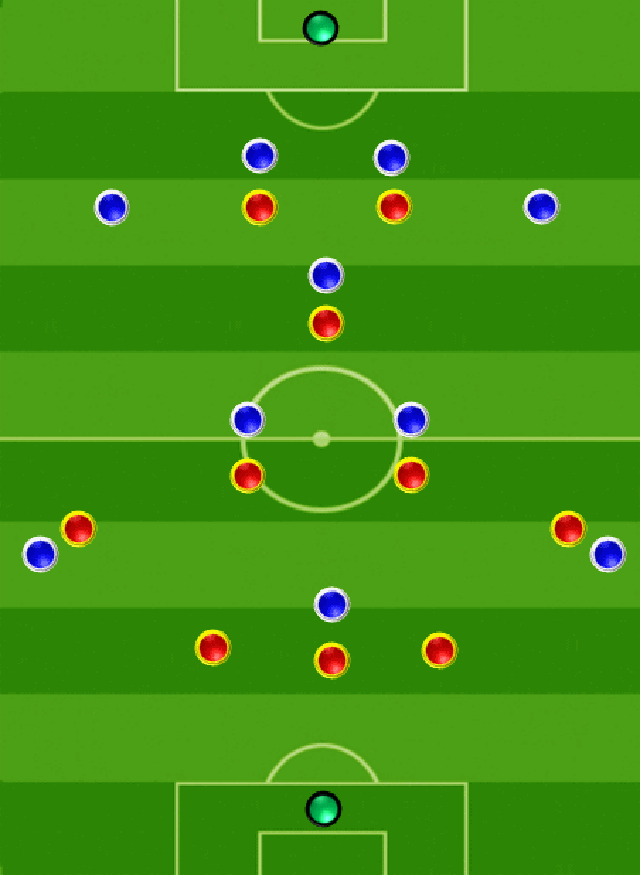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스리백은 수비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낭비하며 그로인해 다른 지역에서 수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을 미드필더로 올리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수비수들은 지금처럼 발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다. 헤라르드 피케(바르셀로나), 제롬 보아텡(바이에른 뮌헨) 등이 주목 받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부터다. 때문에 수비수를 올리는 것보다 수비력을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 4-3-3에서 마이콘, 다니 알베스, 애슐리 콜 등 공격적인 풀백의 등장은 클로드 마켈렐레, 캄비아소, 존 오비 미켈 같은 홀딩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전술은 돌고 돈다. 오프사이드 룰의 완화로 3열(ex 4-4-2)에서 4열(ex 4-2-3-1)로 늘어난 포메이션은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윙어와 풀백에게 엄청난 활동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격은 잘하지만 수비에는 소홀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에당 아자르는 항상 상대팀의 공략 대상이었다. 그리고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그러한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수비형 윙어’ 박지성을 빅매치에 기용했다.
작금의 스리백은 윙어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 스리백에서 아자르와 페드로는 4-2-3-1에서 만큼 수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 아자르가 항상 자신들의 진영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의 델리 알리와 크리스티안 에릭센도 마찬가지다. 3-4-2-1에서 둘은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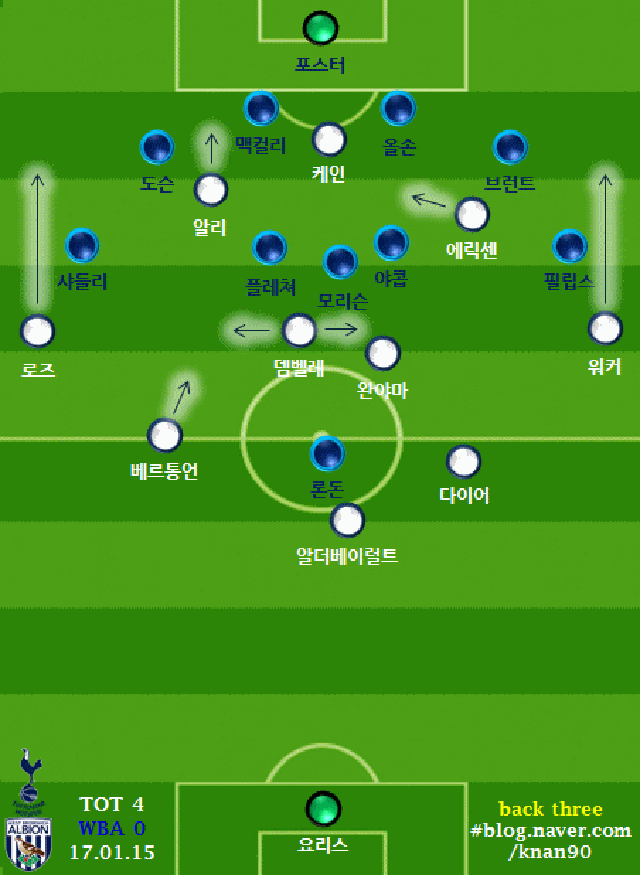
그렇다면, 수비지역에서 수적 ‘과잉’에 놓이게 되는 스리백의 약점은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이는 센터백의 진화와 관계가 있다. 펩 과르디올라의 점유율(possession) 축구가 떠오르면서 센터백도 공을 잘 다뤄야 했다. 자연스럽게 신장이 큰 풀백 자원이 중앙 수비수로 변신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토트넘의 토비 알더베이럴트와 얀 베르통언은 벨기에 대표팀에선 오랜기간 풀백으로 뛴 경험이 있다. 첼시는 풀백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를 3번째 센터백으로 쓰고 있고, 에버턴도 측면이 가능한 메이슨 홀게이트가 스리백에 선다.
이들의 장점은 언제든지 미드필더 지역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르통언은 웨스트브롬위치알비온(WBA)와의 경기에서 사실상 5번째 미드필더처럼 움직였다. 토트넘이 스리백을 쓰고도 ‘잉여’ 자원이 남지 않는 이유다.
맨체스터 시티를 대파한 에버턴도 라미로 푸네스 모리가 중앙으로 전진했다. 간혹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푸네스 모리를 쫓았지만 공이 반대편으로 이동하면 또 다시 홀게이트가 자유로워졌다. 물론 시무스 콜먼이 위치한 우측 지역에서 가엘 클리시에게 공간을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쿠만 감독은 18살 톰 데이비스의 활동량으로 이를 커버했다. 심지어 데이비스는 후반에 체력이 떨어진 클리시의 뒷공간을 질주해 데뷔골까지 터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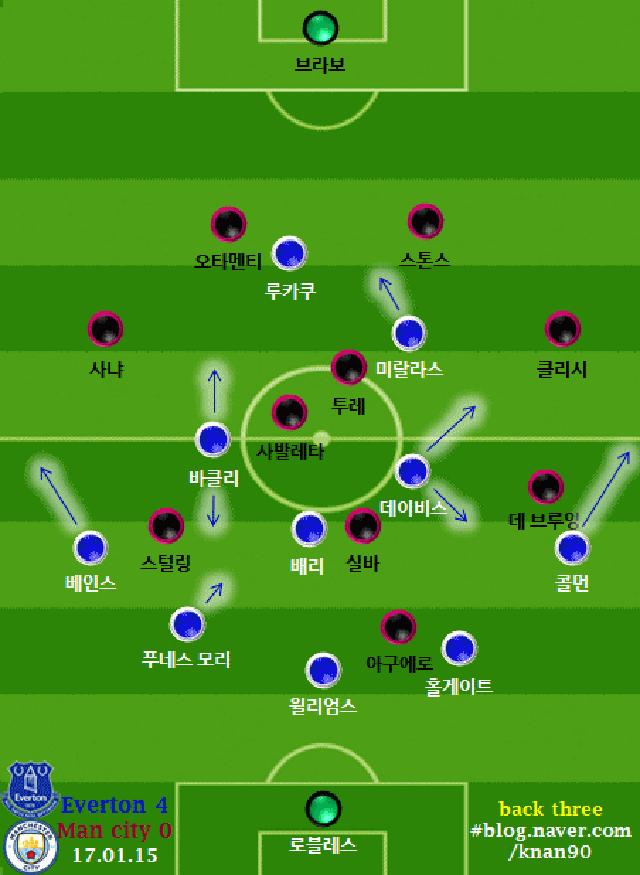
스리백 부활은 세컨볼 싸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르디올라는 최근 영국 현지 인터뷰에서 세컨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선 대부분 공이 잔디가 아니가 공중에 떠 있다. 뮌헨 시절 사비 알론소는 나에게 세컨볼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진짜였다. 잉글랜드에서 세컨볼, 써드볼 아니 4번째볼까지 적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영국의 전술칼럼니스트 마이클 콕스는 “몇 년 전만해도 잉글랜드에서 세컨볼에 신경 쓰는 감독은 샘 앨러다이스와 토니 풀리스 뿐이었다. 하지만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들이 늘어나면서 수적 우위를 통해 불확실한 세컨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자주 펼쳐지고 있다. 또 압박을 피하기 위해 늘어난 롱볼도 세컨볼의 중요성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스리백 기반의 3-4-2-1 포메이션은 바로 이 세컨볼을 따내는데 유리하다. 가운데 4명의 미드필더가 사각형을 이뤄 4-3-3 또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에버턴은 가레스 배리, 데이비스, 로스 바클리, 케빈 미랄라스가 중앙에서 좁게 포진해 맨시티 3명의 미드필더(야야 투레, 파블로 사발레타, 다비드 실바)를 상대로 ‘4vs3’의 우위를 점했다. 미랄라스의 추가골 장면에선 로멜루 루카쿠까지 내려와 세컨볼을 따내기도 했다. 토트넘도 알리, 에릭센, 무사 뎀벨레, 빅터 완야마가 WBA 3명의 미드필더를 가두고 공을 손쉽게 소유했다. (베르통언까지 전진하면 ‘5vs3’의 상황까지 됐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과르디올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맨시티에서 사각형 미드필더를 만들기 위해 풀백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세웠다가, 나중에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2명의 인사이드 포워드(실바와 케빈 데 브루잉)를 배치했다. 하지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 스리백 가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쟁팀이 쓰는 걸 지켜보고 있다.
어쨌든 스리백은 새로운 해석과 함께 재탄생 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분명 또 다른 약점이 발견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픽 = 안경남 knan0422@mydaily.co.kr/ 사진 = AFPBBNEWS]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