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쓴 딥 퍼플 평전 'Deep Purple'[김성대의 음악노트]
- 가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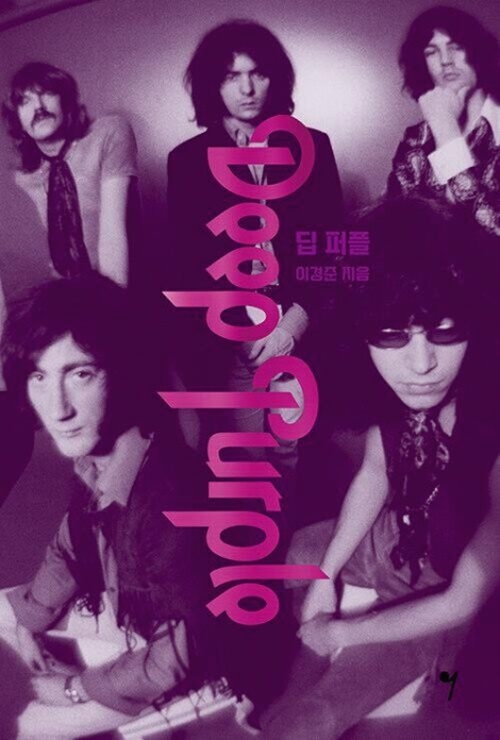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지금은 고인이 된 신해철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할 때 딥 퍼플 얘기가 나왔었다. 'Deep Purple In Rock'(이하 'In Rock'), 'Fireball', 'Machine Head'를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갈 기세로 흠모해온 그는 존 로드와 리치 블랙모어를 자신의 아내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사랑을 넘은 그 경외심은 차라리 그가 보컬리스트로서 그토록 닮고 싶어 한 롭 핼포드에게 보인 선까지 넘어선 듯했다. 2006년 어느 날, 나는 마왕과 "영국 하드록과 동의어"였던 밴드 하나를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웃고 떠들었다.
내가 딥 퍼플을 처음 만난 건 중학생 때였다.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테이프를 주워 무심코 카세트에 넣었는데 테이프가 플레이된 이후 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때 흘러나온 곡은 다름 아닌 딥 퍼플의 대표곡이자 세계 대중음악사에 길이 빛날 명곡 'Highway Star'였다. 이 곡이 나를 사로잡은 포인트는 네 군데였다. 도입부 이언 길런의 청천벽력 샤우팅, 중반부 존 로드의 문어발 건반 솔로, 중반 이후 "모두가 두 손 모아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 솔로, 그리고 버스(Verse)마다에 콤마를 찍어준 이언 페이스의 후련한 스트로킹 필인까지. 이름 모를 컴필레이션 테이프를 통해 이 곡을 듣고 나는 'Machine Head'부터 시작해 "기타 로큰롤 레코드"를 만들겠다는 리치의 신념이 존의 신념을 꺾은 'In Rock'을 지나 존 로드가 "'In Rock'보단 나은 작품"이라고 자평한 'Fireball'과 새로운 보컬/베이시스트를 맞아 발매한 'Burn', 토미 볼린이라는 괴물 기타리스트를 영입해 내놓은 'Come Taste The Band'까지 딥 퍼플 탐구를 이어갔다.
하지만 딥 퍼플이 위대한 건 신해철과 내가 똑같이 침을 튀겨가며 극찬한 몇 작품을 남겨서가 아니라 2022년인 지금도 그 팀이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실제 딥 퍼플 가입 전 이미 초절정 테크니션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스티브 모스가 들어온 뒤 이들은('Abandon' 정도를 빼고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전성기 느낌을 내는 앨범"들을 최근까지 잇따라 내놓았다. 신기한 건 존 로드가 빠지고 돈 에어리가 합류한 첫 앨범 'Bananas'부터 그 음악적 내구성은 더욱 견고해졌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딥 퍼플은 역사에 길이 남을 록 기타리스트 세 명(리치 블랙모어, 토미 볼린, 스티브 모스)이 거친 팀이었고, 그 팀을 만들고 이끈 리치를 통해 지금까지도 아성이 건재한 명 싱어들(이언 길런, 데이비드 커버데일, 로니 제임스 디오, 그레이엄 보넷, 조 린 터너)을 만나는데 산파 역할을 한 밴드였다. 딥 퍼플이 없었다면 우린 레인보와 디오, 화이트스네이크와 알카트라즈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90년대였다. 나는 듣기만 하던 대중음악을 '읽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은커녕 인터넷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무렵, 정말 뭣도 없었던 시대였다. 팩트 체크는 언감생심, 부정확한 정보마저 부족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그런 시절 해외 잡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건 정보의 반독점과 같은 말이었고, 그것은 곧 평론 시장에서 '힘'을 뜻했다. 하지만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절에도 우린 한국인이 직접 쓴 해외 공룡급 뮤지션/밴드들의 전기(傳記)나 평전을 찾기 힘들다. 록/헤비메탈에서만 한정해 보자면 우리에겐 아직도 한국인이 쓴 AC/DC와 에어로스미스, 주다스 프리스트와 아이언 메이든, 너바나와 펄 잼, 메탈리카와 메가데스, 본 조비와 건스 앤 로지스, 레이지 어겐스트 더 머신과 콘에 관한 제대로 된 평전, 전기가 없다. 손익분기를 따져야 하는 출판사들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람이 직접 쓴 해외 밴드의 평전 한 권이 시장에 나왔다. 바로 이경준의 'Deep Purple'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인이 직접 쓴 딥 퍼플 평전"이라는 사실이다.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영미권 밴드를 국내 사람이 직접 쓰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단 영어 원서(이 책에선 총 12권이 동원됐다)를 정독해야 하고 관련 음반과 영상들을 정주행 해야 하며, 영문 잡지와 웹진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 중 집필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직접" 써내는 것이다. 번역이 아닌 직접 쓴 해외 아티스트 평전은 일단 글쓴이가 가진 느낌과 해석이 덧붙여져 좋다. 딱딱한 역사책을 읽는 기분에서 따뜻한 산문집을 읽게 만드는 힘은 바로 그 "직접 쓰는" 과정에 있다. 가령 데이비드 커버데일과 글렌 휴스를 영입한 딥 퍼플 3기(Mark III)를 "핵심 부품이 달라진 딥 퍼플이라는 본체"라 표현한 문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이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비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책에서 소개한, 리치 블랙모어가 강령술을 위해 '샤이닝'의 잭 니콜슨 마냥 도끼로 멤버(로저 글로버) 방문을 찍는 에피소드나 1997년 남미 투어에서 'Highway Star'를 연주하는 스티브 모스에게 침을 뱉은 관객 등은 단순히 멤버 소개와 디스코그래피 설명으로 채워 넣는, 리뷰도 아니고 비평도 아닌 어정쩡한 '보도' 수준의 잡지 글에선 읽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구체적이고 방대한 자료, 그리고 그 자료들을 요리하는 요령은 아마도 번역가이기도 한 필자가 작업한 책들을 거치며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역한 '컴플리트 데이비드 보위'에서 그는 집필에 앞서 자료를 모으는 일이 힘겹지만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지미 헨드릭스와 핑크 플로이드, 조니 미첼 평전을 번역하면서는 그러모은 서말 구슬들을 어떻게 보배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남몰래 내공을 쌓은 글쓴이는 자신이 독자(팬)이자 필자(평론가) 입장에서 딥 퍼플 앨범들과 공연, 밴드의 행보에 결부된 팩트와 인용을 설레는 마음으로 조립해 그것들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나갔다. 단, 그는 과도한 해석과는 거리를 두었다. 마치 음반이나 곡들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펼쳐야 할 때 억지스러운 인상 비평을 쓰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라도 하듯 이경준은 차라리 그 자리에 잘 쓰인 해외 평론가, 저널리스트들의 문장을 가져와 넣는다. 과유불급에 기반한 이 느슨한 배치 전략은 의외로 이 책의 논리 전개에 윤활유 역할을 하며 평전 자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이경준의 'Deep Purple'은 국내 평론가들에게 저자 자신이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 그리고 남들이 알아야 할 것만 쓰라는 말을 곱씹게 하는 책이다.
70년대 하드록은 이른바 '아재들의' 장르다. 그 아재들은 보통 물리적인 음반 수집과 감상만으로 그 밴드와 작품을 다 이해했다고 자위하는 1차원적 부류와 장르 자체를 한물간 음악이라며 여전히 그걸 찾아 듣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부류로 나뉜다. "배신과 계략으로 가득"찬 딥 퍼플 역사를 다룬 이 책은 바로 그런 아재들에게 무엇에 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어떤 것을 잘 안다고 말하는 일이 얼만큼 조심스러워야 하는 일인지도 더불어 일깨워준다.
[사진제공=그래서음악]
*이 글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약력
한국대중음악상선정위원
마이데일리 고정필진
웹진 음악취향y 필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