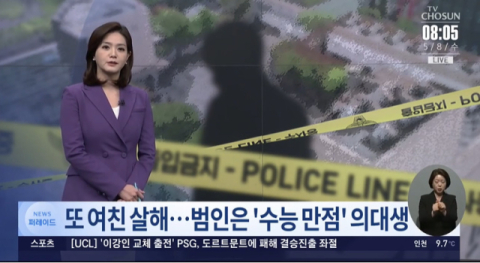잠실라이벌 어린이날 시리즈, 그 특별한 의미
- 가
- 가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특별한 의미가 있다.
LG와 두산은 이번 어린이날에도 어김없이 맞대결을 치른다. 두 잠실 라이벌의 어린이날 맞대결 역사는 깊다. 1996년 더블헤더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997년, 2002년을 제외하고 계속 맞붙었다. 홈과 원정을 매년 바꿔가며 19경기를 치렀다. 전적은 12승7패로 두산 우세.
어린이날을 포함한 3연전 시리즈서는 두산이 12차례, LG가 6차례 위닝시리즈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두산이 연이어 어린이날에 웃었고, 2승 1패 위닝시리즈를 챙겼다. 재미있는 건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어린이날 승리 팀이 어린이날 3연전서 위닝시리즈를 챙겼다는 점이다. 그만큼 어린이날 맞대결은 특별하다.
어린이날 맞대결서 극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다. 1996년에는 더블헤더가 열렸고, 두산이 싹쓸이했다. 2경기 연이어 9회초에 결승점을 뽑아냈다. 시작에 불과하다. 1998년에는 LG가 박종호의 끝내기 몸에 맞는 볼로 승리했다. 1999년에는 두산이 안경현의 끝내기홈런, 2005년에는 역시 두산이 홍성흔의 끝내기안타로 승리했다.
최고의 흥행보장카드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어린이날 잠실구장은 매진됐다. 이번 어린이날에도 매진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날씨도 좋다. 더구나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팬들로선 야구장 방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

▲특별하다
두산과 LG에 선수단에도 어린이날 맞대결 포함 3연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령탑들도 의식하고 있다. LG 양상문 감독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LG가 이기는 걸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 팬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나. 어린이 팬들에게 LG가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의무"라고 했다. 더구나 이번 어린이날 3연전은 LG의 홈 경기다. LG로선 승리에 대한 욕구가 하늘을 찌른다.
OB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두산 김태형 감독은 어린이날을 떠나서, LG와의 맞대결 자체가 특별하다고 했다. 김 감독은 "LG와는 확실히 다른 팀과는 다른 뭔가가 있다. 내가 선수생활 할 때는 LG에 많이 밀렸다.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만회했던 기억이 난다. 작년에도 LG만 만나면 팽팽했다(8승8패)"라고 회상했다.
구체적으로 김 감독은 "선수들은 어린이날 맞대결서 예민했던 것 같다. 벤치클리어링도 자주 나왔다. 의욕이 커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회상했다. 실제 2007년 5월 4일 경기서 두산 안경현과 LG 봉중근이 격투기를 연상시키는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다음날 화해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지나친 의미부여 경계
어린이날에 두 팀의 의욕이 높아지는 건 기정사실. 그런데 감독들은 지나친 의미부여를 경계한다. 어린이날 맞대결도 한 시즌 16차례 맞대결 중 1경기다. 더 크게 보면 정규시즌 144경기 중 1경기일 뿐이다. 어린이날 3연전 역시 수 많은 3연전 중 하나다. 어린이날에 이긴다고 해서 2승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감독 입장에선 많은 어린이 팬이 현장을 찾는 어린이날에 반드시 이기고 싶은 건 맞다. 그러나 장기레이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어린이날 맞대결에 올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스코어가 벌어지면서 승패가 갈렸는데 어린이날 필승 목적으로 필승계투조를 기용할 수는 없다. 두 팀은 쉼 없이 6~8일에도 롯데(두산), NC(LG)와 3연전을 이어간다. 더구나 LG의 경우 5일 맞대결을 마치고 창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LG 양상문 감독은 "어린이날 1승도 똑같은 1승이다. 그러나 다른 날보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두산 김태형 감독도 "LG전이라고 해서 더 크게 이기고 싶지는 않다. 모든 팀에 다 이기고 싶을 뿐이다. LG전도 똑같은 1승"이라고 강조했다.
두 잠실라이벌에 어린이날 맞대결은 특별하다. 그러나 그 특별함을 너무 강조하고 싶지도 않은 게 두 사령탑의 솔직한 심정이다.
[어린이날 맞대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