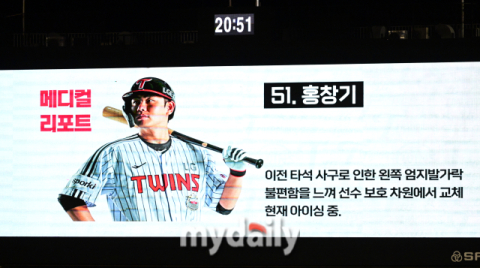소리없이 '소울'의 소리를 지배한 팀, 나인 인치 네일스[김성대의 음악노트]
- 가
- 가

영화 ‘소울’은 현세와 내세를 오가며 인간 삶을 관조하는 영화다. 더 정확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열정, 인간이 살면서 설정하는 목표를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다. 한 비평에서 ’형이상학 재즈 무비’라 불린 만큼 그 관조는 재즈라는 오래된 대중음악 장르와 앰비언트라는 침묵의 대중음악 장르를 통해 펼쳐진다.
여기서 존 바티스트가 맡은 재즈는 밝고 북적대는 현세를 이끌고 이면의 앰비언트는 어둡고 차분한 내세를 그린다. 나는 이 중 후자를 얘기할 것이다. 트렌트 레즈너라는 90년대 음악 천재와 2005년부터 그의 파트너가 된 영국 뮤지션 겸 엔지니어 애티쿠스 로스의 프로젝트. 이 영화의 반쪽을 책임진 느긋한 전자음은 다름 아닌 나인 인치 네일스(Nine Inch Nails, 이하 ‘NIN’)의 솜씨였다.
사실 영화에 NIN의 음악이 흐를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봤으면서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이게 정말 내가 알던 NIN의 음악이란 말인가. ‘Head Like A Hole’과 ’Mr. Self Destruct’, ‘Happiness In Slavery’와 ‘We’re In This Together’를 만든 바로 그 NIN?
어쨌든 사실이었다. NIN는 영화 ‘세븐’(1995)이나 ‘로스트 하이웨이’(1997), 또 다른 ‘소울’을 다뤘던 브랜든 리 주연의 1994년작 ’크로우’(트렌트 레즈너는 이 영화 OST에 ‘Dead Souls’라는 곡을 제공했다)에서와는 많이 다른 영화 삽입곡을 ‘소울’에서 실험한 듯 보였고, 그 시도는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픽사의 23번째 작품에 최적의 소리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과거 트렌트가 주도했던 트렌드와는 꽤 거리를 둔 결과물이었다. 그 음악에는 클래쉬의 펑크록도 데이비드 보위의 글램록도 없었다. 물론 지저스 앤 메리 체인과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노이즈 팝, 바우하우스와 조이 디비전 풍 포스트 펑크도 아니었고, 스로빙 그리슬의 인더스트리얼 소음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다. 차라리 이번 작업에서 NIN는 팀 명성에 힘을 보태준 저런 전설들 대신 다른 사람을 주목했다. 바로 ‘앰비언트의 대명사’, 브라이언 이노다.
그러니까 트렌트는 20여 년 전 미니스트리와 견인한 인더스트리얼 록이 아닌 브라이언 이노가 개척한 앰비언트에서 ‘소울’의 음악 해답을 찾았다. 보컬의 절규와 전기 기타의 굉음을 깐 헤비 일렉트로닉 텍스처는 지금 NIN에겐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이었다. 트렌트와 애티쿠스는 그런 디스토피아의 혼돈보단 유토피아의 희망, 삶의 긍정을 표현할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다. 힌트는 멀리 있지 않았다. 그들이 2008년에 선보이고 12년 뒤 다시 이어간 앨범들. ‘Ghosts’ 시리즈는 그 답을 조금은 알고 있는 듯 보였다.
혹자가 “백일몽의 사운드 트랙”이라 일컬은 2008년작 ‘Ghosts I-IV’는 총 36트랙을 담아 다크 앰비언트를 좇은 NIN의 야심작이다. 트렌트는 아무래도 이 작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Ghosts I’(이 앨범에는 총 아홉 곡의 ‘Ghosts I’이 있다)에서 ‘소울’에 응용할 요소를 찾은 듯 보인다. 물론 2020년에 내놓은 ‘Ghosts V-VI’ 역시 이듬해 완성품을 위한 좋은 습작이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영화 제목인 영혼(Soul)이 장르 뿌리로서 재즈와 부합 했다면 또 다른 영혼(Ghost)은 그 음악에 담긴 적막의 속성으로 작품과 조우한 셈이다.
존재의 조건이면서 음악 장르를 이르기도 하는 영화 ‘소울’은 ’물과 바다의 이야기’로 삶을 묻고 ‘순간의 행복’으로 삶을 정의내린다. 버디무비와 로드무비의 느슨한 공식 아래 피카소와 몬드리안의 모더니즘이 뿌리를 내리며, 그 뿌리가 다시 모던 재즈와 만나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다. 그 안에선 ‘사랑과 영혼’(1990)과 ‘그래비티’(2013)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1984) 등이 무더기로 피어올라 언젠가 조니 캐쉬도 불렀던 NIN의 히트곡 ’Hurt’의 시린 감성에 조우한다. 그렇게 반젤리스 같은 ‘The Great Beyond’가 조용히 일어서고 아름다운 ’Just Us’가 그 기립을 잠재운다.
이것은 마치 ‘라라랜드’(2016)와 ‘트론: 새로운 시작’(2010)을 묘하게 변주한 느낌에 가깝다. 재즈와 삶이 하나, 전자음악과 상상이 또 다른 하나다. NIN은 바로 그 천상천하의 변주를 자신들의 소리로 소리없이 지배하고 있었다.
[사진제공=유니버설뮤직코리아]
*이 글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약력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마이데일리 고정필진
웹진 음악취향Y, 뮤직매터스 필진
대중음악지 <파라노이드> 필진
네이버뮤직 ‘이주의 발견(국내)’ 필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