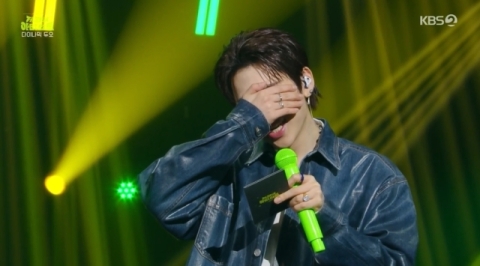[곽명동의 씨네톡]김훈의 피난열차, ‘부산행’의 슬픈 자화상
- 가
- 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칼의 노래> 작가 김훈은 산문집 <바다의 기별>에서 한국전쟁의 풍경을 소개했다. 피난민들은 열차에 개미떼처럼 붙었다. 지붕 위의 아이들은 떨어져 죽었다. 졸다가 죽고, 바람에 날려 죽었다. 터널 천장의 늘어진 철근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쳐 죽었다.
객실 안의 고관대작들은 피아노를 싣고, 세퍼트를 실었다. 개집을 싣고, 요강까지 실었다. 지붕 위의 피난민들 자식이 떨어져 죽을 때, 고위층들은 객실에서 여유를 부리며 유유자적 부산으로 향했다.
영화 ‘부산행’을 보며 김훈이 회고한 한국전쟁의 부산행 열차가 떠올랐다. 아비규환이었을 것이다. 지붕 위에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객실에선 그들이 죽든 말든 ‘나 하나 잘살면 그만’이라는 고관대작들이 세퍼트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부산행’의 좀비떼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국가는 방역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고, 언론은 그들을 폭도로 규정했다. 방송에선 “가만히 있으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어른들은 좀비떼에 공격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조선으로 부르는 현실과 겹쳤다.
객실 안의 대기업 상무 용석(김의성)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기주의의 화신이다. 다른 승객들이 감염이 되든 말든, 저 혼자 살겠다고 핏대를 올린다. 부산 피난열차의 고관대작처럼, 그에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
‘부산행’은 헬조선의 디스토피아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용석만 비난할 수 있을까. 겨우 살아남은 익명의 승객들은 살기 위해 객실문을 닫는다. 끝내 열어주지 않는다. 작금의 한국사회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기 보다는, 나만의 생존을 위해 고개를 돌린다. 그렇게 문을 닫고 도착한 부산은 과연 안전한 곳일까.
당신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때, 또 다른 타인 역시 당신의 아픔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